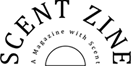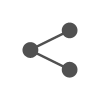- 장소 : 반 고흐 미술관 (Van Gogh Museum)
- 위치 : Museumplein 6, 1071 DJ Amsterdam The Netherlands
센티는 만약 네덜란드에 있는 고흐 박물관에 간다면, 꼭 보고 싶은 그림 있어?
나는 고흐의 <사이프러스 나무가 보이는 밀밭>이라는 작품을 직접 보고 싶어.

고흐가 이 그림에 대하여 그의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를 읽은 이후부터 이 그림을 좋아하게 되었지.
삶의 고통에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었을 때, 밀밭을 보며 잠시 위안을 얻고 그렇게 다시 나아가라고 그가 마치 위로를 건네주는 것 같았거든.
불평하지 않고 고통을 견디고, 반감 없이 고통을 직시하는 법을 배우려다 보면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건 가능한 일이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막연하게나마 희망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삶의 다른 측면에서 고통이 존재해야 할 훌륭한 이유를 깨닫게 될지도 모르지. 고통의 순간에 바라보면 마치 고통이 지평선을 가득 메울 정도로 끝없이 밀려와 몹시 절망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에 대해, 그 양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그러니 밀밭을 바라보는 쪽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게 그림 속의 것이라 할지라도.
– 책 <반 고흐, 영혼의 편지> 중에서
“지독한 가난, 고독, 예술에 대한 끝없는 집착, 발작, 요절…. 반 고흐는 37년의 짧은 생애 동안 극적인 삶을 살면서 강렬한 작품을 남겼고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넘었다.”
<반 고흐, 영혼의 편지>를 출간한 “위즈덤하우스”는 서평에 그의 삶을 위와 같이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 맞아. 고흐는 “예술을 향한 끝없는 집착”으로 무엇보다 유명하지. 하지만 그 집착은 다름 아닌, 사람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아.
나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고, 살지 않을 것이고, 살아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얼어붙든가 돌로 변하거나 할 것이다…
이 감옥을 없애는 게 뭔지 아니? 깊고 참된 사랑이다.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가치이며, 그 마술적 힘이 감옥 문을 열어준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다.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곳에서 인생도 다시 태어난다. 이 감옥이란 편견, 오해, 치명적인 무지, 의심, 거짓 겸손 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사랑에 빠질 때 그것을 이룰 가능성을 미리 헤아려야 하는 걸까? 이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 어떤 계산도 있을 수 없지.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책 <반 고흐, 영혼의 편지> 중에서

그의 넘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외로웠어. 그는 고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넘치는 사랑을 오로지 그림에 담아내기로 결심한 듯 그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냈지.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그림만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의미가 되었던 거야.
저는 계속 고독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도 망원경을 통해 희미하게 바라보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제 그림은 조금씩 더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림 그리는 일은 다른 일과는 차이가 있지요.
작년에 어디에선가 글 쓰는 일과 그림 그리는 일은 아이를 낳는 일과 같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는 일이 글을 쓰거나 그림 그리는 일보다 더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 일이 서로 비교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무엇보다 제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비록 그림 그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받지 못하는 일 중 하나이지만, 저에게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유일한 고리거든요.
책 <반 고흐, 영혼의 편지> 중
반 고흐는 자신만의 빛깔을 찾아내기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걸었어.
왜 우리 이런 말 자주 듣잖아.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너의 모든 열정을 바쳐라! 이런 류의 이야기들. 하지만 현실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아. 그리고 그 일을 찾았다고 해도 진짜로 무언가를 시작하기란 더더욱 어렵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도 매우 크게 작용하고.
하지만 고흐는 이렇게 말해. 아무것도 없는 빈 캔버스보다 그림을 그린 캔버스가 더 가치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 만으로 시작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림을 그린 캔버스가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캔버스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 이상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단지 그 사실이 나에게 그림을 그릴 권리를 주며,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 그래, 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책 <반 고흐, 영혼의 편지> 중에서

오늘은 우리 센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시작하는 데 조금이라도 용기를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보았어. 하지만 그 와중에 있지 말아야 할 게 있어.
바로 삶의 균형이야. 누군가 아래와 같이 멋진 글을 써놓았더라고. 균형에서 얼마나 벗어날지에 대한 균형에 관한 이야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센티만의 향기가 피어날 거 같아.
빈센트 반 고흐는 빛과 색의 덧없이 스쳐가는 인상을 캔버스에 옮기는 작업에 전념했다. 나는 고흐의 광적인 붓놀림을 볼 때마다 지독한 불만을 엿보게 된다. 내가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편집광의 노예였다. 그들을 이끌어간 원동력은 균형을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힘이었고, 나는 그 힘이 창조력의 원천이었다고 주장한다. 소설가 아나이스 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어떤 것은 항상 과잉에서 태어난다. 위대한 예술은 극도의 공포, 극도의 외로움, 극도의 억제와 불안정성에서 태어났다.”
예술을 위해 고통받도록 태어나지 않은 우리들(대다수의 사람들)조차 개인의 사생활에서 균형이 너무 지나치면 따분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늘 판에 박힌 일상을 적으로 생각해 왔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삶이란 결국 적을 가장 친한 친구로 삼는 일이다. 자신만의 개성과 열정을 통제하고 (사실상 부정하고) 외부 세계의 시스템과 부딪혀 어떤 충격도 경험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차단해버리면, 그 사람은 세상과의 접촉이 끊겨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르고 만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살기 시작한다…
결국 문제는 균형에서 얼마나 벗어날지에 대한 균형을 잡는 일이다. 전략적으로 균형을 벗어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
<뉴필로소퍼 Vol.8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것> 중에서